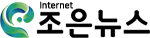소고기란 건 아예 몰랐고 돼지고기는 농번기 때 한번 쯤 무국에 한두 점 얹어 놓아 논바닥으로 내오는데 그 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홀했다. 또 하나는 김이다. 김이란 것이 요즘 김은 왜 그 맛이 없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김은 아궁이에 짚불을 때고 그 벌건 잿불에 김을 구워 상에 올리면 사람들은 그 맛에 또한 환장했다. 손으로 편지 쓰던 사춘기 때는 구구절절이 사랑을 담아 신경을 곱빼기로 써서 보내도 메아리는 별로 없었다.
간혹 뭍으로 유학을 나간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오면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하고 글자 하나하나에서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속도와 정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가 됐다. 익명으로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사이버 시대가 됐다.
과거엔 편지를 보내면 가고오고 해서 열흘 정도나 돼야 회신을 받았는데 요새는 이메일이란 것이 생겨서 즉시 전송이 되고 즉시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국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외국에 보내는 편지도 즉시 가고 즉시 온다. 편지뿐인가. 인터넷 전화가 있어서 그런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수시로 전화를 한다. 옛날 같으면 전화요금 땜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 사람이 국내 있는 것인지 외국에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국내서 통화하듯 부담 없이 떠든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90년대 초에 처음 외국엘 나갔는데 그 땐 외국 음식이 참으로 고역이었다. 그런데 요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음식 비스무리 한 음식이 많아서 큰 문제가 없다.
퓨전음식이 된 것이다. 세계는 이제 동일 생활권이다. 소위 글로벌시대란 말이다. 신학교 다니던 시절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때 회사 풍경은 청타 치느라 딱딱딱 소리 사방에서 들리고 나는 그거 교정보느라 체크하고 수정하고 따 붙이고 종이편집하고 참으로 아날로그적인 업무였다.
신문사에 보내는 원고를 급한 것은 전화로 불러주기도 했다. 전화는 수동식으로 핸들을 잡아 돌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팩스가 나오고 컴퓨터가 급격히 보급되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든지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세상이 됐다. 리모컨으로 모든 걸 컨트롤 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로 문자송수신이 되니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인간이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너무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 인간화를 상실하고 있다. 콩 한 쪽도 나눠먹던 정겨운 시골풍경은 사라지고 주차문제로 칼부림이 나는 판국이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안 되는 세상이다.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했다. 디지털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좋긴 한데 웬지 그래도 더러 옛날이 그립기도 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자꾸 옛것을 그리워한다.
시골밥상을 찾고 손으로 편지쓰기도 그립고 구수한 된장찌개도 그립다. 비 오는 날 부침개 해 먹는 풍경이 피자 시켜 먹는 걸로 대치되고 식당에서 밥 먹고 부족하면 무한리필 하던 시절은 어디 가고 공기마다 계산이 추가된다. 가을 기운이 무르익어 썰렁하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따듯한 사람이 더 그리워진다. 아니 아날로그 시절이 그립다. 단풍놀이를 가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걸 못한 것일까. 아마 마음의 여유가 아직도 안 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