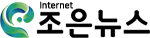그 시절에도 가르치기 위해 훈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훈장이 다 퇴계나 율곡 같을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어느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이고 학부모는 정성껏 훈장의 살림을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열 두 번은 바뀌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3강 5륜이나 가르쳐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범대학·교육대학을 나오고도 순위고사를 치르어야 하고
각 급 학교의 교단에 서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일제하에 교원자격시험을 거치고 어느 시골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여 3학년 담임이 되었을 때 내 반에는 나와 나이가 동갑인 정희택이라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교단에 서는 일이 매우 자랑스러웠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각 급 학교에는 잘 준비된 우수한 젊은이들만이 교단에 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였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포부가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해 미국의 전국 교원 대회의 표어가 “가르치는 일을 자랑스럽게”(Proud To Teach)라고 듣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육자들에게는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부심이 없는 것은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일도 없겠지만 준비된 대답도 없다고 믿습니다.
따분한 삶이 오늘의 선생님들의 삶입니다.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신나는 일이 전혀 없고 날마다 따분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원들의 자질이나 능력 또는 업적의 평가를 학부모나 학생들이 할 수 있습니까.
교장·교감은 왜 있습니까.
교육위원이나 장학관은 왜 있습니까.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지요.
교원 임용시험을 누가 맡아서 실시했습니까.
학부모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학교 운영이나 학생 교육을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들의 아버지·어머니에게 맡기고 교육 당국은 “난 모른다”하는 겁니까,
그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교수들이 모여서 총장을 선출하고,
학생들은 모여서 교수와 교사를 평가한다면
교육당국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고 휘청거리니까 전국 교원 노조와 같은 가공할 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동길 박사
desk@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