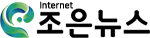어제 글에 이어 시인 임태주의 어머니가 남긴 시의 나머지 부분을 싣습니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어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재첩 한 소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 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무를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 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네가 내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 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내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하였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이 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너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네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너가 애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나기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그루 밝혀서
천지신명께 기댔다.
운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진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너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네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말아라.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